서울 부동산 시장의 핵심 축 중 하나인 용산구 이촌동이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며, 시장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거주 중심의 거래만 허용하는 이번 조치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중개업소의 목소리와 실제 거래 변화를 통해 살펴본다.
왜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을까?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집값 급등 억제를 이유로 강남3구에 이어 용산구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지정 후 6개월 간 적용되며, 추후 연장 또는 해제를 검토한다. 이 결정은 사실상 이촌동의 거래를 틀어막는 효과를 가져왔다.
강남 해제 이후 ‘풍선 효과’…용산으로 불똥 튀다
지난달 강남3구 일부 지역이 토허구역에서 해제되며 시장에 유동성이 풀렸다. 이에 따라 수요가 용산으로 몰리는 움직임이 있었고, 정부는 이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용산 전체를 규제 지역으로 묶은 것으로 해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이촌동 부동산에 미친 영향

거래 제한으로 실수요자도 막혔다
토허구역 지정은 투자 목적의 거래뿐만 아니라, 기존 실수요자의 ‘갈아타기’도 어렵게 만든다. 기존 집을 팔고 전세를 끼고 이사오려던 수요자들이 거래를 중단했다는 현장 중개업소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33평으로 갈아타려던 계획이 다 무산됐다.”
“한 달만 여유를 줬어도…” – 이촌동 A중개업소 관계자
80% 이상이 ‘전세 끼고 있는 매물’
이촌동의 부동산 시장 구조상 대부분의 매물이 전세가 낀 형태다. 실거주 입주만 허용되면서 이들 매물은 사실상 거래 불가능 상태에 놓였다. 이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은 급격히 감소했다.
이촌동 집값, 오히려 급등세 보여…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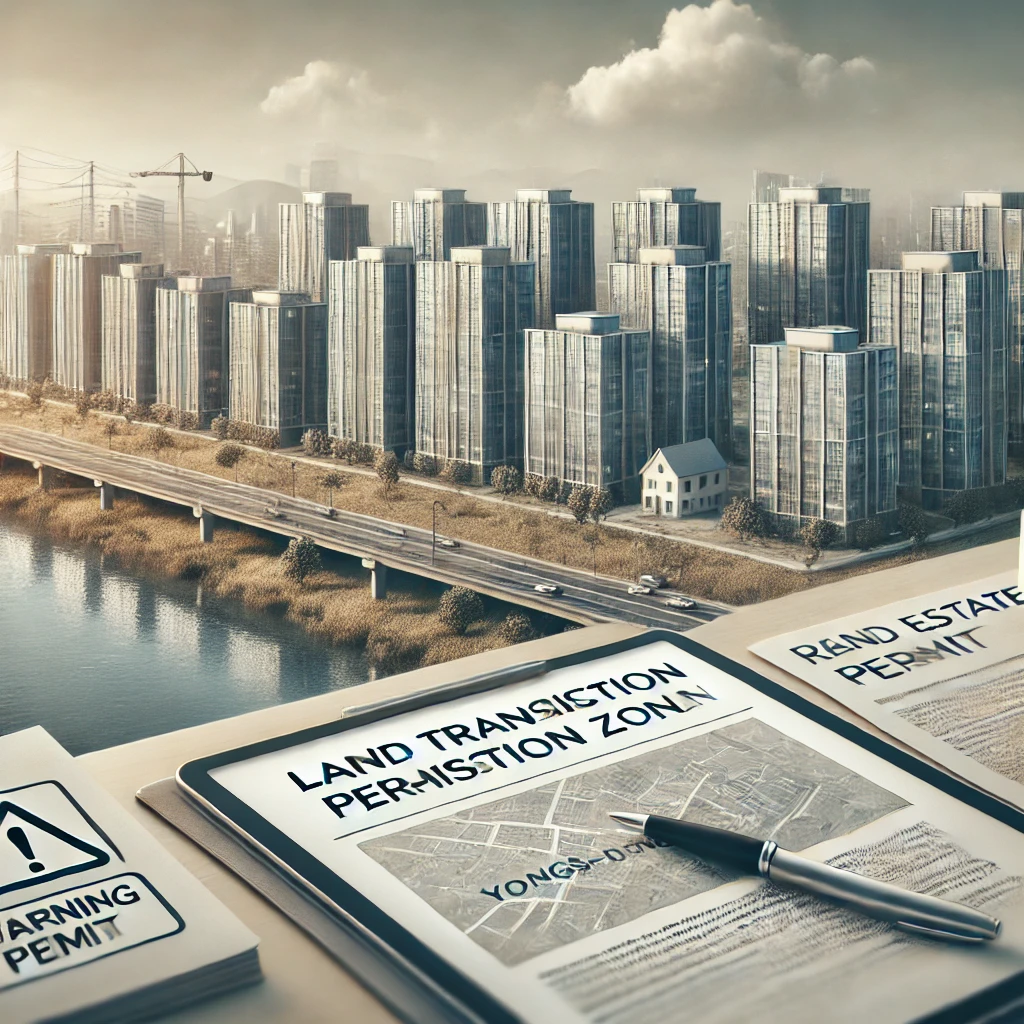
아이러니하게도 토허구역 지정 전후 이촌동의 집값은 3억 원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수요자가 미리 매수에 나섰고, 매물 소진에 따른 희소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단기간 가격 급등 사례
- 한가람아파트 25평형: 16억8000만 → 18억5000만 (약 1.7억 상승)
- 20평대 아파트: 한 달 사이 16억대 → 19억대 (약 3억 상승)
이러한 급등은 수요 집중과 규제 발표 전 ‘막차 타기’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 시장은 냉각 중
중개업소 ‘붕괴 직전’…민심은 들끓는다
중개업소들은 규제에 따라 거래가 급감하며 생존 위기에 처했다. 이들은 “시장에 맡기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정자들의 정책 실험에 서민만 고통 받는다.”
“거래를 막으니 실수요자도 피해 입는다.”
풍선효과 우려…다음은 성동·동작?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가 이촌동에서 차단되며, 인근 지역인 성동구, 동작구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규제의 불균형이 투기지역 간 도미노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의 전망과 정책 개선 방향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한 접근 필요
모든 거래를 묶는 규제보다는, 실거주 요건 강화나 전세 투기 차단과 같은 정밀 타깃 규제가 필요하다. 전면적 토허구역 지정은 지나친 조치일 수 있다.
지역별 맞춤형 대책 필요
지역의 거래 유형과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은 시장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 용산과 같이 재개발·재건축 이슈가 많은 지역은 정책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요구된다.
🔍 결론: 시장은 살아있는 유기체, 정책은 섬세해야 한다
용산구, 특히 이촌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분명한 시장 충격을 가져왔다. 정책의 의도와 시장의 현실이 괴리될 때, 결과는 예측과 다르게 나타난다. 실수요자마저 배제하는 방식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